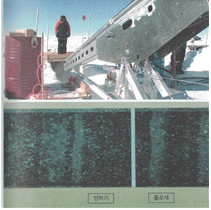학술대회논문
메이지의 신도행정・신도와 조화삼신
이시하라 야마토(石原和)
2021년 봄 증산도 문화사상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
메이지의 신도행정・신도와 조화삼신
이시하라 야마토(石原和, 리츠메이칸대학 강사)
Ⅰ. 들어가며
일반적으로 일본신화의 ‘조화삼신’이란 아메노미나카누시노카미天之御中主神・타카미무스비노카미高御産巣日神・카미무스비노카미神産巣日神를 말한다. 이 조화삼신은『고사기古事記』 서문의 ‘세분의 신은 조화(창조)의 머리를 이룬다’라는 기술에 근거한다. 그런데 이러한 천지창조 신화는『고사기』 상권 중에서도 가장 후대에 삽입되고 부가된 부분이라고 여겨진다. 이러한 후대 부가설을 뒷받침하는 사례로는『고사기』가 완성된 지 8년 후의『일본서기日本書紀』일서사一書四에는 ‘일서에 이르기를’ 이라는 인용형식으로 쿠니노토코타치노미코토(國常立尊) 생성 후 ‘또 이르기를 타마마가하라高天原에서 태어난 신’이라고 기술 되어 있으며 이 삼신은 보조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조화삼신 개념은 중국의 영향을 받아 선진시대 상제 개념이 알려진 이후에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견해와 육조도교의 원시천황의 영향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조화삼신은 일본 외부에서 들어온 개념으로 동아시아적인 성격을 부여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중국을 중심으로 한 문명의 형태에 맞추어 가는 과정에서 필요했던 기술이었던 것이다. 사실 동아시아에 통용되는 정사로 편찬되었다고 하는『일본서기』에는 보다 구체적인 특징이 나타나 있다. 『일본서기』 앞 부분에는 『고사기』에는 없는 중국에서 유래한 개벽신화가 『회남자淮南子』와 『삼오역기三五歴紀』를 발췌하여 편집한 형태로 실려 있다. 이것은 당시의 일반론으로 제시된 것이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고사기』와 『일본서기』의 신화는 동아시아 세계의 보편성을 갖춘 것이었다. 백강전투(663)와 임신의 난(壬申の乱, 672) 후를 경험한 7세기 초에 동아시아 보편성에 입각하는 것이 스스로의 지배 정통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기능하였던 것이다. 적어도 조화삼신이 삽입된 것은 이와 관련된 것이었다.
그 후 중세가 되면『일본서기』에 독자적인 신화와 해석을 추가한 중세일본기中世日本紀가 전개 된다. 이때에는 대외적으로 정통성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들의 사찰이나 신불의 정통성을 드러내는 내용이 보인다. 조화삼신에 관해서는 그 중에서도 이세신도적 입장에서 도요우케노오오미카미豊受大御神는 미나카누시노카미天之御中主神라는 설이 주장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신도오부서神道五部書』등에 보이듯이 전근대의 이세신도설은 외궁의 신직神職을 중심으로 전개된 것으로 자신이 모시고 있는 도요우케노오오미카미를 내궁의 아마테라스오오미카미天照大神와 대등한 황조신이라는 것을, 천손을 강림시키는 주재신으로서 미나카누시노카미과 도요우케노오오미카미를 동일시하는 것으로 주장된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도 점차 도요우케노오오미카미는 미나카누시노카미라는 인식으로부터 도요우케노오오미카미는 쿠니노토코타치노미코토(國常立尊)라는 인식으로 이행하게 된다.
근세가 되면 국학 연구자들은 중국서적을 인용하여 개벽을 묘사한 후 타카마가하라高天原로 이야기가 진행되는『일본서기』대신 천지개벽을 이야기하지 않고 타카마가하라로부터 시작되는『고사기(古事記)』의 가치가 상승하게 된다. 이러한『고사기』에 대한 주목에서 나온 것이 모토오리 노부나가本居宣長의 사상 전개이다. 근세후기에 살았던 그는 ‘중국적인 것漢意’을 배제하고 ‘일본’의 독자적인 가치를 찾으려고 하는 사상사적 전개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조화삼신에 관해서는 핫토리 나카츠네服部中庸의 『삼대고三大考』에 천지개벽으로부터 천天・지地・황천泉의 분리를 나타낸 그림이 보이고 노리나가와 히라타 아츠타네平田篤胤로 계승되어 간다. 노리나가는 아마테라스오오미카미를 중심으로 하는 신관념을 제시했지만 아츠타네는 이 조화삼신, 특히 미나카누시노카미를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복고신도復古神道를 주창하게 된다. 그리하여 원래는 후대에 기술된 조화삼신의 지위가 급격히 상승하였다. 이 과정에 동아시아적 보편성을 부여하기 위한 조화삼신에서 일본의 독자성을 주장하기 위한 조화삼신으로의 전환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이 생긴 것은 어디까지나 근세 후기의 일부 국학자와 그 영향을 받은 인물들 사이에서의 제한적인 동향이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현대 우리들의 신관념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은 메이지기 이후의 신도 행정이나 히라타 아츠타네의 신도관神道觀과 연결된 종교인들의 활동과 관련된 측면이 크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성을 억제하지 않은 채 조화삼신이라는 시점에서 동아시아의 신관념을 단절하기는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조화삼신이 어떻게 국가적, 국민적 인지를 얻게 되는지를 메이지 시대의 신도의 전개와 관련지어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근대 동아시아에서 조화삼신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망도 제시하고 싶다.
Ⅱ. 신기관 체제 속의 조화삼신
메이지 정부는 출범 초부터 제정일치 국가체제를 목표로 신도를 중심으로 한 국가 건설을 위한 정책을 전개해 나간다. 예를 들면 근세 신사와 신직을 관할했던 요시다가문吉田家, 시라카와가문白川家이라고 하는 전통적 신사체제를 해체하고 그 대신 고대 율령제를 본떠 신기관神祇官을 부흥시켜 신기 행정을 담당하게 했다(메이지 4년[1871]). 또한 신사의 내부에도 변화를 일으킨다. 에도시대 이전에는 함께 섞여 있었던 신사와 사찰을 분리하고 신사를 국가제사의 일부로 규정하는 체제를 준비했다(이른바 신불판연령神佛判然令, 1868). 또한 결국에는 근대적 호구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실제 도입은 보류되었지만 신사와 국민을 연결시키기 위해 백성들을 사찰의 단가檀家로 관리하는 사단제寺壇制를 대신하여 백성들을 우지코(氏子)로서 신사에서 관리하게 하는 우지코시라베氏子調(모든 인민의 강제적 신사 귀속 정책)라는 구상도 있었다.
이러한 신사의 지위 확립과 대국민 접근책 동향과 병행하여 메이지 2년(1869), 신기관에 교도국教導局과 선교사宣教使가 설치되었다. 전자는 ‘칸나가라노미치惟神之大道(천황을 중심으로 한 제정일치)’를 체계화하고 교화하기 위한 기관이며, 후자는 그 이념을 국민에게 전하는 역할을 맡은 직책으로서 만들어진 것이었다. 이 신기관 교도국-선교사체제에서는 쵸슈번長州藩 출신인 오노 노부사네小野述信, 츠와노번津和野藩의 후쿠바 비세이福羽美静가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다만 이 당시에는 아직까지는 어떠한 신도가 새로운 국가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완수할 것인가, 어떠한 교리를 확립해 갈 것인가 같은 문제로 논쟁이어서 교도국·선교사의 ‘교무’에 대한 회의는 대혼란에 빠졌다.
그 중에 조화삼신에 대한 의미에 관한 발언도 나오므로 토코요 나가타네常世長胤의『신교조직이야기神教組織物語』에서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토코요는 오노가 제창하는 신에 대한 관념(이세파伊勢派)에 부정적인 입장인 히라타파국학平田派国学 계보(이즈모파出雲派)였으며 여기서 언급하는 발언은 그러한 입장에서 오노의 발언에 대한 비판적 기록을 남긴 것이다.
당시 오노를 지지하는 세력은 조화삼신의 신덕神德도 오오쿠니누시노카미大国主神(이즈모의 제신으로 사후 세계의 주재신으로 간주되었다)의 역할도 아마테라스 오오미카미로 일체화하는 아마테라스오오미카미교라고 할 수 있는 신학을 공인 교학으로 창출하려고 했다. 즉 황조신으로서의 아마테라스오오미카미를 중심으로 하는 신도체계를 제시하고 아마테라스의 현신인 천황을 중심으로하는 국가상이라는 개략적인 개념이 제시되었다. 이에 대해 토코요는 오노이 주장 즉 아마테라스를 중심으로 하여 ‘조화삼신에 기반하지 않으며 다만 아마테라스오오미카미만을 지존으로’하는 신관념에 대해 그것은 ‘원래 유교적 견해에서 나온 교지’라고 비판을 가하고 있다. 이 비판의 배경에는 오노와 같이 황조신皇祖神=아마테라스를 중심으로 한 국가 이데올로기화를 지향한 이세파신도伊勢神道와 종교적 안심安心으로서의 내세성·종교성을 강조하는 맥락에서의 제정일치를 주장하는 입장의 창조신인 조화삼신, 저승의 주재자인 오오쿠니누시노카미大國主神를 중시하는 히라타파신도(이즈모)·츠와노의 신관념에 대한 대립이 있었다. 이 회의는 결론이 나지 않았고 최종적으로는 메이지 3년(1870) 12월 신도행정에서 히라타파를 지지하는 세력이 배제된다. 그 결과 천황에 대한 충성만을 강조하여 절대화하고 아마테라스오오미카미를 황조신으로서의 신격으로 확정해 가는 방향이 정착하게 되었다.
이상의 전개에서 조화삼신에 대해 확인해 두고 싶은 것은 주류파가 된 아마테라스 중심의 신도에서는 조화삼신이 중시되지 않았으며 조화삼신을 중시한 히라타파 국학 관계자는 배제되었다는 되었다는 점이다. 이 메이지 2년(1869) 단계에서는 근대국가구상 속에서 조화삼신의 지위는 부수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다.
Ⅲ. 교부성 체제와 조화삼신
이리하여 아마테라스 중심의 신도를 중심으로 하는 방향이 정해지고 선교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유력 복고신도가復古神道家의 협력을 얻지 못함으로써 교화 담당자가 부족하였고 불교의 반발을 받아 구상대로 진행되지 않아 노선을 변경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심지어 메이지 4년(1871) 말기에 후쿠바와 오노를 지지한 쵸슈계 관료인 키도 타카요시木戸孝允와 시마지 모쿠라이島地黙雷 등이 서양 시찰을 가게 된다. 이들을 대신한 임시대행정부에는 사츠마계 관료가 진출하여 이지치 마사하루伊知地正治의 영향 아래 히라타파신도의 색채가 짙은 정책으로 전환하게 된다.
메이지 5년(1872) 3월의 신기성神祇省 폐지와 교부성教部省 설치는 본래는 서양시찰 전의 쵸슈계 관료가 계획한 것이었지만 서양시찰 후에는 이세파 신직이 배제되고 히라타파의 영향을 받아 전개되어 간다.
이 교부성의 사명은 ‘기존의 여러 종교 사무를 총괄하고 신교 및 유교 불교 모두 각각 교정을 두고 학생을 교육하고 인민을 선도하는’ 것으로 ‘공화정치학을 강의하고 국체를 멸시하고 새로운 정치를 주장하며 민심을 선동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신직과 승려를 교도직에 임명하여 국민교화 담당자로 삼았다. 또한 교화의 기본이념으로 ‘신에 대한 공경과 나라사랑을 명심할 것’, ‘천리인도天理人道를 밝힐 것’ ‘천황을 받들고 그 교지를 준수할 것’이라는 ‘삼조교칙三条教則’을 반포하여 교화체제를 정비해 나갔다. 또한 불교의 각 종파도 이에 호응하여 가담하였고 불교 각 종파의 제안을 받아들여 교도직 육성기관인 대교원大教院을 설립하게 된다. 이 대교원은 도쿄에 설치되었고 부府와 현縣에 중교원, 소교원을 두고 교도직 육성과 조직화가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신불합동포교가 시작되는데 거기에는 신도와 불교 간의 주도권 다툼이 전개되어 가게 된다.
메이지 6년(1873) 1월에 도쿄부의 전 기이번紀伊藩 저택에서 대교원 개원식이 열렸으나 불과 1개월 후에 시바증상사芝増上寺로 이전하게 된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대교원 설립은 불교 각 종파가 원하던 것으로 이러한 불교 측의 압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교부성에서도 사찰에 신전을 설치함으로써 불교 측의 주도권을 빼앗으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일환으로 교부성은 대교원과 함께 시바대신궁芝大神宮을 이 증상사로 이전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있다.
실제로 시바대신궁은 이전되지는 않았지만 증상사 본당에 조화삼신이 합사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교화를 실시할 수 있다고 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즉 교부성 아래에서 신불 양파 사이에 주도권 다툼이 있었던 가운데 증상사는 그 최전선에 있었던 것이다. 그중 신도파는 그곳에 합사되어 있던 조화삼신에 입각하여 자신의 주도권을 확립시키려 했던 것이다. 이 조화삼신을 기초로 대교원 체제 안에서 신도 세력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고 있었던 것은 교부성의 구상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는 네 신에 대한 존숭은 정교의 기본으로서 교도직 등원 시에는 이에 배례하고 그 후에 설교에 종사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신기관 체제에서는 아마테라스로 일원화된 질서였던 것에 비해 교부성 체제에서는 조화삼신이 추가되게 되어 있다. 이는 구상에 머무르지 않고 메이지 6년(1873) 6월에 완성한 대교원신전大教院神殿에는 실제로 이 네 신이 모셔진 것 같다. 그것은 메이지 6년 10월에 정해진 ‘대교원규칙大教院規則’ 별책에서 교도직이 대교원을 들어가고 나갈 때에는 축사를 해야 하게 되어 있었던 것으로부터도 엿 볼 수 있다. 또한 이 신전은 교도직 외에도 일반인의 참배를 허용하고 있었다. 그 배경에는 신전의 권위나 조화삼신·아마테라스오오미카미·천황에 대한 경의를 국민에게 침투시키는 것이 기획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메이지 6년 말엽부터 교도직이 활동 할 때의 교화계몽이념으로서 십칠겸제十七兼題가 추가되었다. 그 영향으로 조화삼신과의 관계에서 도덕 준수를 강조하는 설교가 두드러지게 된다. 예를 들면 가시마신궁鹿島神宮의 아요야기 타카토모青柳高鞆는 ‘사람된 자는 조화삼신…에 의해 태어나’, ‘군신, 부자, 부부, 형제, 붕우의 오륜의 도를 만들면서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항상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여 군신의 도를 언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람은 조화삼신이 창조한 존재이기 때문에 도덕적이어야 한다는 설교가 전개되었다.
이상에서 히라타파 국학의 영향 하에서 진행된 신기관 폐지로부터 교부성 설립이라고 하는 흐름 안에서 신불 합동 포교가 시작되어 그 속에서의 불교 측과의 주도권 싸움을 거치고, 신기관 체제하에서 배제된 조화삼신이 재부상해 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화삼신은 대교원의 제신祭神이자 정교의 기본이며 교도직이 공통으로 경배하는 대상으로서 뿐만 아니라 대교원이 참배 문호를 넓히고 교도직이 행하는 설교 속에서 도덕적 근거가 됨으로써 일반인들 사이에도 퍼지고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교부성 체제는 조화삼신의 침투·정착에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런 체제는 오래가지 않았다. 신불합동포교라고 하면서도 폐불적인 자세를 숨기지 않는 히라다파 국학을 기반으로 하는 신도에 치우친 여러 정책에 대해 불교 측의 비판이 높아져 결국 대교원에서 불교 각 종파가 잇달아 이탈하게 되었다. 그리고 서양 시찰에서 돌아온 쵸슈계 관료들이 다시 실권을 잡게 된다. 또한 서양의 정교관계를 배우고 대교원에서 이탈한 불교 각 종파의 주장을 대변하는 입장에 선 시마지 모쿠라이 등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자유론과 정교분리론이 고조되게 된다. 이리하여 신도 중심의 국가체제 자체가 비판받게 되어 메이지 8년(1875) 대교원이 해체되고 메이지 10년(1877)에 교부성이 폐지되어 내무성 사사국内務省社寺局으로 이관되게 된다. 이후 국민교화는 교육-교육칙어(教育勅語)등을 통해 신도를 매개하지 않는 방법으로 전환한다.
Ⅳ. 교파신도와 조화삼신
메이지 10년대에 들어설 무렵부터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 아래 신도를 둘러싼 정책은 수정되어 간다. 그 일환으로 메이지 15년(1882)에 교도직과 신사신직의 겸임이 폐지된다. 이전에는 신직이 교도직 역할을 맡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다. 히라타파 국학에 기초한 종교적 신도관 하에서 제도화된 교도직이 신직에서 분리되는 것은 종교활동과 신사의 분리를 의미하고 있었다. 즉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 아래에서도 신사와 국가(천황)가 국민과 연결되는 통로로 두기 위해 신사에서의 종교행위는 허락되지 않는 행위로 여겨졌다. 이렇게 해서 표면적으로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를 이루면서 신사를 매개로 한 국민통합을 도모하는 이른바 일본식 정교분리가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 결과 신사는 종교성이 박탈되고 국가 제사의 최전선에 서게 되었다.
이 궤변이라고도 할 수 있는 논리를 가능케 한 것은 근대적 ‘종교’ 개념과 종교의 자유론에 기초한 신사 비종교론이었다. 원래 ‘종교’라는 단어는 전근대 일본에는 없었던 것으로 메이지 이후에 서양에서 온 religion의 번역어로 탄생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religion에서 ‘종교’로 언어가 대체된 것이 아니라 religion이 갖는 문화적 시대적 배경도 함께 일본에 이입되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세계 여러 나라를 문명국, 반문명국, 미개국이라는 3종류로 분류하고 그에 따라 국가주권의 유무를 설파하는 만국공법체제 아래 문명국의 지표로 여겨졌던 기독교적 종교관과 결합하여 이 용어가 성립된 것이다. 이때 문명국 종교의 바람직한 모습은 성경과 같은 경전에 기초한 교리신앙=belief 중심주의적인 모습이었다. 서양국가들과의 조우 속에서 식민지화를 회피하면서 자신의 주권을 확보하려고 했던 일본에서는 ‘종교’라는 단어의 이입은 근대화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었다. 이 단어의 이입에 의해서, 생활 속에서 관습화한 practice=의례 중심이었던 기존의 일본의 종교는, 교리=belief 중심주의로 변모시켜 가게 된다.
일본 근대화의 과제 속에서 생겨난 이 ‘종교’라는 단어는 근대 한어漢語(중국 ‘宗教zong jiao’ / 한국 ‘종교 jong gyo’ / 베트남 ‘Tôn giáo’)로 유학생이나 일본의 식민지 지배 등을 통해 동아시아를 석권하게 된다. 물론 거기에는 문명론적·기독교적 함의가 포함되어 있어 새롭게 이입된 지역의 종교계에 변화를 재촉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이러한 belief 중심주의적인 ‘종교’ 개념을 전제로 하면서 신사 비종교론이 전개되었던 것이다. 물론 몇 몇의 신도론과 사상이 전개되었음은 틀림없지만 근세까지의 신도는 신기신앙神祇信仰 즉 의례적인 측면이 컸다. ‘종교’ 개념의 이입에 있어서는 신도에서도 교리화를 도모하게 된다. 그러나 그것이 여의치 않게 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다. 신도의 교리화 실패를 역이용하여 신도를 교리신앙 즉 ‘종교’로 간주하지 않음으로써 신도의 장소인 신사에서의 활동을 의례로 한정지었다. 이렇게 신사에 대한 숭배는 ‘종교’행위가 아닌 도덕행위로 간주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일본형 정교분리가 이루어졌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국가제도적 측면이었다. 여전히 신사는 종교행위의 장이었으며 신도는 저세상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신직들도 있었고 일반 국민에게도 그러한 신사가 더 일반적이었다. 예를 들면, 히라타파·이즈모파, 진구교神宮敎의 후신인 신궁봉재회神宮奉斎会 관계자가 중심이 되어 종교로서의 신도의 활동거점 설치를 호소하는 신기원神祇院 설치운동과 그것을 지지하는 역할도 담당한 전국신직회가 전개되어 갔다. 물론 이러한 종교성 유지 지향은 종교인의 긍지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었다. 정교분리 원칙 속에서 신사의 역할이 제한되어 가는 가운데 당초에는 정액 경비가 지급되던 관사官社조차 메이지 19년(1986)에 자사자영自社自営의 방침이 세워져 다음 해부터 대폭적으로 금액을 줄인 보존금을 지급하게 되었다(官国幣社保存金制度). 이러한 가운데 메이지 10년대에는 그보다 하위에 놓인 여러 신사나 신직은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이 되었다. 즉, 교부성 체제 해체 속에서 국가에서 신사로의 자금이 유입이 중단되어 자립화가 절박하게 되어 있었다. 그런 가운데 종교인들에게 종교활동은 수입을 올리는 중요한 수단이었던 것이다. 일반 국민은 아무리 메이지로 세상이 바뀌었어도 여전히 전근대부터 계속해서 신사, 신직에게는 현세이익 역할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신도로부터 종교를 분리하는 국가 방침 아래, 어떤 방법으로 종교 활동이 유지되어 왔는지를 아래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교파신도화
우선 첫째로 교파신도로서 독립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메이지국가는 국민통합에 뜻을 두고 종교성을 배제한 의례로서의 신도를 창조했지만, 사람들의 종교에 대한 현세 이익과 후세 안심에 대한 수요와 갈망이 쉽게 억제될 수 없다는 현실과도 마주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 가운데 국가와 연결되는 의례로서의 신도와 신도의 종교적 측면을 이해하여 교파신도로서 독립시키는 방침을 취하게 된다. 그에 따른 대표적인 사례로 이즈모다이샤(出雲大社)의 대응을 들 수 있다. 이즈모다이샤는 히라타파국학의 영향을 받으면서 신도의 종교성을 주장하는 입장에 있었다. 메이지 15년 신사와 종교활동이 분리된 후 종교활동을 유지할 수 없게 된 이즈모다이샤는 그해 안에 국가의 제사를 담당하는 이즈모다이샤로부터 종교활동의 영역을 분리해 이를 오오야시로교大社教로 독립시키고 있다. 이세신궁과 부적 및 이세력伊勢暦 배포 등을 담당한 진구교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모든 종파가 이러한 신사와 종교활동 분리라는 형태로 교파신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당시 사람들이 요구한 종교활동의 수용자가 되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었다.
이러한 역할을 완수한 교파신도 교단으로는 쿠로즈미교黒住教, 신토슈세이파神道修成派(1876년 공인), 진구교神宮教, 오오야시로교大社教, 후소교扶桑教, 짓코교実行教, 타이세이교大成教, 신슈교神習教(1882년 공인), 미소기교禊教, 신리교神理教(1894년 공인), 콘코교金光教(1900년 공인), 텐리교天理教(1908년 공인)가 있었으며 여기에 신도대교神道大教(신도본국)을 더해 13파가 된다. 이들 교단은 무조건 공인된 것이 아니라 활동 공인화를 위해 국가의 신화체계와 모순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변용시킬 필요가 있었다. 변용 시에는 신도의 종교성을 강조하는 히라타파 신도를 바탕으로 하는 교단도 많았으며, 이를 통해 조화삼신이 교리에 편입되는 예도 볼 수 있었다. 예를 들면, 근세에 발생한 후지코富士講의 계보를 잇고 있으며 시바타 하나모리柴田花守가 창립한 짓코교의 교리 중에는 아메노미나카누시노카미와 그 신으로부터 탄생한 타카미무스히노카미, 카미무스비노카미라는 조화삼신을 주재신으로 하고있으며 자신들의 교리에서는 후지산에 그러한 주재신이 임재한다고 말하고 있다. 즉 후지코적 신앙이 교파신도화될 때 히라타파 신도가 메이지 초년 이래 강력하게 주장했던 조화삼신이 포함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마찬가지로 후지코의 계통을 잇는 것으로 시시노 나카바宍野半가 개창한 후소교와 그 외에도 닛타 구******츠新田邦光의 신토슈세이파, 요시무라 마사모치芳村正秉가 개창한 신슈교, 이노우에 마사카네井上正鉄의 미소기교에서 아메노미나카누시노카미를 중심으로 타카미무스히노카미, 카미무스비노카미를 더한 조화삼신을 주재신으로 하는 종파를 볼 수 있다.
2. 교파신도 산하 종교인화
그렇지만 모든 종교인이나 신앙집단이 교파신도화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교파신도로 공인받기 위해서는 아마테라스오오미카미를 주신으로 하는 쿠로즈미교와 같이 국가 신도와의 교리적 친화성이 있던지 교조가 근왕지사였던 신토슈세이파와 같이 이와쿠라 토모미岩倉具視 등의 정부요인과 연결되어 있던지 혹은 근본 교리를 국가 신도에 맞추어 수정한 텐리교와 같이 교파신도화를 위한 부단한 노력과 희생이 적지 않게 필요했다. 당연히 일반 민간종교인들의 힘으로는 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교파신도(혹은 불교 교단) 산하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경로는 남아 있었다.
교파신도 아래에는 그 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코샤講社를 두는 것이 인정되고 있었다. 메이지의 종교정책 아래 폐업 위기에 처해 있던 종교인들은 자신들의 코샤 별로 혹은 스스로 교파신도 산하로 내려감으로써 종교활동을 유지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신토슈세이파나 온타케교와 같은 산악계 교파신도가 그 수용체가 된 예를 볼 수 있다. 이 때 비교적 자유롭게 이전 활동을 지속한 예도 볼 수 있다.
또한 이런 종교인 수용이 종교활동 현장에서 더욱 확산되는 사례도 나타났다. 그 대표적인 예로 나가사와 카츠타테長澤雄楯의 이나리코샤稲荷講社가 있다. 나가사와는 히라타파 국학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른바 혼다영학本田霊学을 대성한 혼다 치카아츠本田親徳의 제자로 진혼귀신鎮魂帰神을 중심으로 한 활동을 하는 종교자였다. 또한 메이지 초년의 신도의 형태에 대한 논의 중에서도 신도의 종교성을 호소하는 입장에 서 있었다. 그는 이런 논의 중 관계를 맺은 오오야시로교 관장 센게 타카토미千家尊福와의 인연으로 오오야시로교의 교사가 되었고 오오야시로교 하에서 활동을 시작하여 이나리코샤를 일구었다고 생각된다. 여기까지는 다른 교파신도-코샤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었던 현상이지만 이 이나리코샤의 경우 그 산하에 다른 종교인이나 교회를 관할한 예가 보인다. 그 관할 아래에서 활동한 대표적인 종교자로 데구치 오니사부로出口王仁三郎가 있다. 나중에 오오모토교大本教의 교주가 되는 그는 메이지 30년대 전반에 종교활동을 시작했을 무렵 활동 공인을 받기 위해 다양한 교파신도 산하로 내려가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온타케교에서 활동하다 실패하고 다이세이교에서도 실패하여 어쩔 수 없이 또 다시 먼저 총본부를 찾아’갔고 이나리코샤 산하에서 종교 활동을 실현시켜 가게 된다. 그리고, 오오모토교의 전신인 킨메이레이각카이金明霊学会도 이 코샤의 관할에서 활동을 전개시켜 가게 된다. 이나리코샤 자체도 오오야시로교 아래에서의 활동으로부터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상과 같이 교파신도→코샤→관할교회라는 조직 중 어딘가에만 들어가면 종교활동을 실현할 수 있는 체제였다.
이러한 체제를 염두에 두고 있어서인지 나중에는 교파신도하에서의 활동 허가를 받기 위한 노하우를 쓴 책도 등장하게 된다. 그것은 그 당시는 물론 교파 신도와 코샤 특유의 논리를 어느 정도 받아들일 필요가 있었음을 반영하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 이나리코샤와 그 아래 관할 교회 간에도 그러한 관계가 있었으며 활동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형태나 규약이 이나리코샤로부터 인정받아야만 했다. 이 집단의 경우는 영술이라는 매우 실천적인 종교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것은 ‘인간은 대정신大精神인 타카미무스비로부터 소정신小精神인 영혼 즉 타카미무스비의 분령分靈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영혼관에 입각한 실천이었다. 이 코샤에 참가하는 사람들이나 그 산하 교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이 영술을 공유하고 실천했다는 점에서 이를 통해 조화삼신의 기능에 대한 이미지가 일반인들 사이에도 퍼졌다고 생각된다. 교파신도 중에는 조화삼신을 주재신으로 하는 신들이 많아 그 산하에 많은 종교인과 신자들이 모여 있었으므로 국가신도의 교리에서는 배제된 조화삼신은 교파신도의 신앙을 통해 민간=종교활동 현장에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Ⅴ. 동아시아의 조화삼신이라는 시점을 향하여
이상 메이지 국가의 종교정책 속에서의 조화삼신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다. 조화삼신은 국가정책의 핵심과는 멀어지게 되었지만 히라타파의 신도론을 형상화 한 교파신도에 의해 민간으로 전개되었다.
사실은 이 외에도 여전히 종교 활동의 실현 수단은 있었다. 제3의 방법으로는 해외에서의 종교 활동이 있었다. 왜냐하면 외지에서는 내지와 다른 종교 법제가 취해져 있었기 때문에 종교 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상황이 계속 되고 있었다. 예를 들면 타이완총독부 하에서는 다이쇼 12년(1923)까지 신사행정과 종교행정이 미분리 상태였고 조선총독부 하에서는 ‘신사사원규칙神社寺院規則’, ‘포교규칙布教規則’이라는 양대 신사 종교행정이 실시되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 아래에서 신직자들은 ‘신관과 교도직 겸직 폐지는 내지에서도 예외가 있다. 즉 부현사府縣社 산하에서이다. 또한 예외적인 예를 넓히면 정부는 타이완에서의 신도포교의 편의를 도모하여 타이완에서 신설해야 하는 관국폐사官国幣社 산하의 신관은 당분간 교사일을 겸직함이 매우 시의에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한다. 나아가 종교활동 실천을 위해 신직자들 중에는 ‘메이지 30년대(1897-1906) 일본 재야 신도자들 사이에 신도를 세계적으로 선포해야 한다는 기운이 일어나고 있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종교 활동의 실천을 바라는 이들은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을 호소하며 부임했다.
일본신도의 해외 포교의 효시가 된 것은 메이지 16년(1883) 신토슈세이파의 조선포교였다. 이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교파신도의 해외 포교와 식민지 신사 정책에는 연속성이 있었다. 메이지 23년(1890)부터 쿠로즈미교는 조선의 경성에서 기도와 병치료를 시작하게 되고 일본영사관은 이에 찬동하고 있다. 쿠로즈미교는 그 거점인 경성대교회를 설립하는데 이것이 경성신사京城神社의 전신인 남산대신궁南山大神宮으로 변화해 간다. 교파신도의 포교가 공설 신사로 되어 가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다. 부산의 용두산신사龍頭山神社에도 신슈교의 해외포교와 관련이 있었다고 보여 진다. 타이완의 경우에는 전 진구교 교사로 타이완신사 초대궁사인 야마구치 토오루山口透의 활동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 예들은 모두 종교성을 우선하면서도 식민지 포교가 진행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 진다.
그들이 담당한 역할이나 거기에서 보이는 조화삼신에 대한 사료가 부족하여 어디까지나 전망을 제시할 수밖에 없지만 메이지 시대 이후의 담당자를 고려하면서 근대 일본으로부터의 확산에 대한 전망을 말하면서 본 논문을 마치려고 한다.
교파신도를 포함한 신직자들의 활동에서 조화삼신이 강조되고 있는 예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삿포로와 사할린을 포함한 식민지에서는 국토를 수호하는 총진수総鎮守로 개척삼신을 모신 것은 주목해 볼만하다. 어떤 이유로 이 삼신이 선정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새로운 영토를 개척함에 있어 천손강림에 앞서 국토를 정비한다는 신화의 역할을 기대하는 맥락에서인지 국토 개벽에 나서는 조화삼신과 같은 삼신이라는 형식이 취해진 점에서는 이러한 연속성이 상상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고사기』의 시점에서는 동아시아의 보편성 속에 스스로를 자리 매김하는 논리였던 조화삼신이 근대에 식민주의를 뒷받침하는 논리로 전환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유의해야 할 것은 조화삼신은 조선에서는 총진수総鎮守에 관한 논의 중에서 제신 후보에 조차 오르지 않았다는 점이다. 오히려 삼한정벌에 기초한 침략과 결부된 신공황후 및 일선동조론과 관련된 스사노오素戔嗚命=소시모리曽尸茂梨 일체설에 기초한 스사노오 제신화에서 볼 수 있는 신화적 통합이 더 직접적인 의미를 부여했다고 생각된다. 그런 의미에서는 조화삼신이 일본제국주의에 휩싸인 근대 동아시아의 저류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적극적으로 식민지 포교를 진행한 교파신도에는 앞서 서술한 대로 주재신으로 조화삼신을 규정하는 경우도 많았다. 교파신도가 아니어도 오오토모교처럼 적극적으로 대륙의 종교인들과 교류한 교단도 있다. 식민지에서 일본 종교는 문명론적인 맥락에서의 근대적 ‘종교’로서 식민지인들과 대치하게 되었을 것이다. 일본내지에서 기독교가 그러했듯이 한편으로는 위로부터의 계몽적 태도를 취하면서 한편으로는 그곳의 근대화를 위한 동경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일본 종교와의 대치 속에서 천도교와 보천교의 문명화가 진전되었다. 그들은 또한 문명의 담당자로서 민간종교를 계몽해 나가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본의 근대화 과정에서 배제된 조화삼신이 근대적 ‘종교’의 모형으로 확산되었을 가능성은 버릴 수 없을 것이다.
(일본어원문)
明治の神道行政・神道と造化三神
石原和(立命館大学)
はじめに
一般的に日本神話において、「造化三神」とは、天之御中主神・高御産巣日神・神産巣日神の三神のことをいう。これは、『古事記』序第一段で「三神造化の首となり」と括られていることを典拠としている。この天地創造神話は『古事記』の上巻の中でも最も新しく挿入されたり、付加されたりした箇所と考えられている。こうした付加説を裏付ける事例として、『古事記』の完成の8年後に成る、『日本書紀』一書四においては、「一書に曰く」という引用形式で、国常立尊の生成の後、「又曰く、高天原に所生れます神」として、この三神は補足的に記述されているに過ぎないことがあげられる。加えて、造化三神には中国書の影響があり、先秦の上帝の観念が知られて以降に成立したものとする見方や、六朝道教の元始天王の影響があると考えられている。こうした意味において、造化三神は、もともと外部的な存在であり、東アジア的な性格を付与されたものであるといえる。すなわち、中国を中心とする文明の型にはまっていくことを志向していく中で必要とされた記述だったのだ。事実、東アジアに通用する正史として編纂されたとされている『日本書紀』には、より具体的にそうした特徴があらわれている。その冒頭には『古事記』にはない中国由来の開闢神話が、具体的には『淮南子』『三五歴紀』を連綴・加工する形で掲載されている。これは当時における一般論として提示されたものであったという意味において、記紀神話は、東アジア世界の普遍性を備えたものであった。白村江の戦いや壬申の乱後を経験した7世紀初頭において、東アジアの普遍性に則ることが自らの支配の正統性を示すものとして機能したのである。少なからず、造化三神の挿入はそれに関わるものだった。
その後、中世になると、『日本書紀』に独自の神話や解釈を加えた中世日本紀が展開していくこととなる。このときには対外的に正統性を示すというよりも、自らの寺社や神仏の正統性を示す展開がみられる。造化三神に関しては、その中で伊勢神道の文脈において、豊受大御神=天之御中主神という説が唱えられる。一般的に『神道五部書』などでみられるように、前近代の伊勢神道説は外宮の神職を中心に展開したもので、自らが祀っている豊受大御神を内宮の天照大神と並ぶ皇祖神であることを、天孫を降臨せしめる主宰神として天之御中主神と豊受大神を同一視することで主張したものだった。ただし、それも次第に豊受大神=天之御中主神から豊受大神=国常立尊へと移行してくこととなる。
近世になると、国学の文脈において、中国書の引用によって開闢を描いたのち高天原へと話が進む『日本書紀』にかわり、天地開闢を語らず高天原から始まる『古事記』の価値が上昇していく。この『古事記』への注目動向の際たる例が本居宣長の思想展開である。近世後期に生きた彼は、「漢意」の排除によって「日本」の独自の価値を見出そうとする思想史的展開に中心的な役割を果たした。造化三神に関しては、服部中庸の『三大考』に天地開闢から天・地・泉の分離を示した図が示され、宣長や平田篤胤へと引き継がれていく。宣長においては天照大神を中心とした神観念が提示されたが、篤胤においては、この造化三神、特に天之御中主神を中核に据えた、いわゆる復古神道が説かれるようになる。こうして、もとはあとから付け加えられた造化三神の地位が急激に上昇していった。この過程に、東アジア的普遍性を付与するための造化三神から、日本の独自性を主張するための造化三神への転回が見出せよう。しかし、こうした動きが生じたのは、近世後期の一部の国学者やその影響を承けた人々の間であって、あくまでも限定的な動向であったということも見逃してはならない。現代の私たちの神観念につながるのは、明治期以降の神道行政や平田篤胤の神道観と継ぐ宗教者たちの活動に関わった側面が大きいと筆者は考えている。そのため、こうした歴史性を抑えないままに、造化三神という視点で東アジアの神観念を切ることははばかられる。以下では、いかにして造化三神が国家的、国民的認知を得ていくのかを明治期の神道の展開と関連付けながらみていくこととしたい。その上で近代東アジアにおいて、造化三神をいかに捉えうるか展望を示したい。
1. 神祇官体制のなかの造化三神
明治政府は発足当初から、祭政一致の国家体制を目指し、神道を中心とした国家づくりに向けた政策を展開していくこととなる。例えば、近世の神社・神職に機能した吉田家・白川家といった本所を解体し、代わりに古代律令制に倣い神祇官を復興させ神祇行政を担当させた(明治4年[1871])。さらに、神社の内部にも変化を起こす。江戸時代以前は相互に混交状態にあった寺社(ただし、神社をその境内にある神宮寺の社僧が所管するなど仏教を優位とする)を分け、神社を国家祭祀の一部に位置づける体制の準備を進めた(いわゆる神仏判然令、慶応4年-明治元年[1868])。また、最終的には近代的戸籍制度の採用によって実際の導入は見送られたが、神社と国民を結びつけるため、領民を寺院の檀家として管理する寺壇制に代わり、国民を氏子として神社に管理させる氏子調の構想もあった。
こうした神社の地位の確立と国民への接近策の動向と並行して、明治2年[1869]、神祇官に教導局・宣教使設置が設置された。前者は「惟神之大道」(天皇を中心とした祭政一致)を体系化し、教化するための機関で、後者はその理念を国民に伝える役割を担った職として位置づけられたものである。この神祇官教導局―宣教使体制においては、長州藩出身の小野述信、津和野藩福羽美静が中心的な役割を担うこととなる。ただし、この当時はまだ、どのような神道が新しい国家において中心的な役割を果たすかを、どのような教義を確立していくかを争っていた段階にあり、教導局・宣教使の「教務」めぐる会議は大混乱に陥った。
そのなかに、造化三神についての位置づけに関する発言も出てくるので、常世長胤「神教組織物語」からその内容をみてみよう。なお、常世は小野が提唱する神観念(伊勢派)に否定的な平田派国学の系譜に与する立場(出雲派)にあり、ここで取り上げる発言は、その立場から、小野の発言を嘲笑的に取り上げたものである。
小野氏ハ上古ニモ例ナキ、一ノ教官ヲ興シタル功績ハ比類ナシト雖モ、元来儒見ヨリ思ヒ起シタル教旨ナレバ、造化三神ニ基ズ、只天照大御神ヲ志尊トシ、又神魂帰着ノ説ニ於テハ、其善ナルハ高天原ニ昇リ、其悪ナルハ夜見国ニ遂ヒヤラハルヽノ私説ヲ主張シ、教官ノ説ヲ矯ル僻アリテ、使中ノ教官此病根ニノミ苦メラレタリ。(「神教組織物語」)
当時、小野らは造化三神の神徳も大国主神(出雲の祭神、幽世=死後の世界の主宰神とみなされた)の役割も天照大神に一体化するような天照大神教とでもいうべき神学を公認教学として創り出そうとしていた。すなわち、皇祖神としての天照大神を中心とする神道体系を提示し、この現世でのあらわれとして天皇中心の国家像のラフスケッチが示されていたのだった。これに対して、常世は、小野が唱える天照中心の「造化三神ニ基ズ、只天照大御神ヲ志尊ト」する神観念に対して、それは「元来儒見ヨリ思ヒ起シタル教旨」と批判を加えている。この批判の背景には、小野のように皇祖神=天照を中心とした国家のイデオロギー化を志した伊勢派の神道と、宗教的安心としての来世性・宗教性を強調する文脈での祭政一致を主張する立場から、創造神である造化三神、あの世の主催者としての大国主神を重視する平田派神道(出雲・津和野)の神観念の対立があった。この会議はもつれ、最終的には、明治3年[1870]12月、神道行政から平田派らが排除されることとなった。結果、天皇への忠誠を抜き出して絶対化し、天照大神を皇祖神としての神格に限定していく方向が定着していくこととなった。
以上の展開で、造化三神について確認しておきたいことは、主流派となった天照中心の神道においては、造化三神は重視されず、それを重視した平田派国学の関係者は下野することとなったということである。この明治2年[1869]の段階では、近代国家構想の中において造化三神の地位は付属的なものでしかなかった。
2. 教部省体制と造化三神
こうして天照中心の神道を中心とする方向が定まり、宣教が開始されることとなる。しかし、実際には有力復古神道家の協力が得られなかったことで教化にあたる担い手が不足したことや、仏教からの反発を受けたことによって、思い通りには進まず、路線変更を余儀なくされることとなる。さらには、明治4年[1871]末、福羽・小野を支持した長州系官僚である木戸孝允・島地黙雷らが渡欧することとなる。彼らに代わる留守政府には、薩摩系官僚が進出し、伊知地正治の影響のもと、平田派神道の色が濃い政策へと転換していくこととなる。
明治5年[1872]3月の神祇省の廃止、教部省の設置は、本来は渡欧前の長州系官僚が計画したものであったが、渡欧後には伊勢派の神職が退けられ、平田派の影響を受けて展開していくこととなる。
この教部省の使命は「在来ノ諸教道ノ事務を総管セシメ神教及ヒ儒仏共各教正ヲ置キ生徒ヲ教育シ人民ヲ善導セシム」ことで、「共和政治ノ学ヲ講シ国体ヲ蔑視シ新政ヲ主張シ民心ヲ煽動スル」のを防ぐこととされた。これに基づいて、神職、僧侶を教導職に任じて国民教化の担い手とした。さらに教化の基本理念として、「敬神愛国ノ旨ヲ体スヘキ事」「天理人道ヲ明ニスヘキ事」「皇上ヲ奉戴シ朝旨ヲ遵守セシムヘキ事」の三条教則を発布し、教化体制の整備を進めていった。さらに仏教各宗もこれに呼応して加わり、仏教各派の提案をいれて教導職育成機関として大教院が設立される。この大教院は東京に置かれ、府県に中教院、小教院をおいて、教導職の育成と組織化がなされた。このようにして神仏合同布教が始まるが、そこには神道と仏教の間の主導権争いが展開していくこととなる。
明治6年[1873]1月に東京府の元紀伊藩邸で大教院の開院式が行われたが、そのわずか1ヶ月後には芝増上寺に移転される事となる。この背景には、大教院の設立を望んだのが仏教各派であったことと関わって仏教側から働きかけがあっただけでなく、教部省としても寺院に神殿を置くことによって、仏教側から主導権を奪う意図もあったとされる。その一環として、教部省は、大教院とともに芝大神宮をこの増上寺に移転したい旨を申し出ている。
芝大神宮御遷座件正院へ伺案
考証課
今般芝増上寺へ大教院移転相成候ニ付而ハ、大神宮奉祀敬神ノ実ヲ表シ度、教正中ヨリ願出候。然ル処、右寺院ハ元来芝大神宮御遷座之旧蹟ニ候間、更ニ本堂ノ中へ御遷宮之上、造化三神御合祀有之、施教之方法速ニ相立候様致度、依之芝大神宮旧蹟考証別紙相添、此段奉伺候也。[以下略]
実際には、芝大神宮の移転はならなかったが、この中で、増上寺本堂に造化三神が合祀されているため、すみやかに教化を行うことができるとしていることは注目に値する。すなわち、教部省下で神仏両派の間で主導権争いがあった中で、増上寺はその最前線にあったのである。その中で、神道派はそこに合祀されていた造化三神に立脚して、自らの主導権を確立させようとしていたのである。それは、この造化三神をもとに、大教院体制の中で神道勢力が主導権を握ろうとしていたことは、教部省の次のような構想にもあらわれている。
造化三神及ヒ皇祖大神ヲ尊崇スルハ政教ノ基本ナレハ、本教ヲ宣布シ、大道ヲ講明セント欲スル者ハ、先四神ヲ敬スヘキ所以ノ理ヲ会得スヘシ。故ニ教導職等登院ノ始ニ此四神ヲ拝礼シテ報本ノ誠ヲ尽シ神ノ感格ヲ祈請シテ後、各説教ニ従事スヘシ。
ここでは、四神の尊崇は政教の基本として、教導職登院の際にはこれに拝礼して、然る後に説教に従事すべきとしている。このように、神祇官体制においては天照に一本化した秩序であったのに対し、教部省体制においては造化三神が加えられるようになっている。これは構想にとどまることなく、明治6年[1873]6月に完成した大教院神殿には実際にこの四神が祀られたらしい。そのことは、明治6年10月に定められた「大教院規則」別冊において、教導職が大教院を入退院する際には「掛巻母恐支天之御中主神高皇産霊神神皇産霊神天照大御神能大前乎謹美敬比皇大御国能本教等高支功蹟表令立給倍止恐美恐美母乞祈奉久斗白須」と祝詞を述べることとされたことからも伺える。また、この神殿は教導職の他にも一般の人々の参詣を許していた。その背景には、神殿の権威や造化三神・天照大神・天皇への敬意を国民に浸透させることが企図されていた。
また明治6年末ころより、教導職が活動を行う際の教化啓蒙理念として十七兼題が加えられた。その影響から、造化三神との関係から道徳の遵守を説く説教が目立つようになる。例えば、鹿島神宮青柳高鞆は、「人タル者ハ造化ノ三神…ニ依ツテ生リ出テ」「君臣父子夫婦兄弟朋友ノ五倫ノ道ヲ生レナガラ御備ヘ下サレ」たのだから、「常ニ其ノ心得ガ無クテハナラヌ」と、特に君臣の道について述べている。このように、人は造化三神に作られたものであるから道徳的でなければならないとする説教が展開することとなった。
以上をみてみると、平田派国学の影響下で進んだ神祇官の廃止から教部省の設立という流れの中で、神仏合同布教が始まり、その中での仏教側との主導権争いを経て、神祇官体制下で排除された造化三神が再浮上してくることがわかる。それは大教院での祭神として、政教の基本として、教導職が共通に敬う対象としてだけでなく、大教院の参拝の門戸を広げたことや教導職が行う説教の中で道徳の根拠とされた事により、一般の人々の中にも広がりつつあった。その意味で、教部省体制は、造化三神の浸透・定着に一定の役割を果たしたと考えられる。
しかし、こうした体制は長く続きはしなかった。神仏合同布教といいながらも、廃仏的な姿勢を隠さない平田派国学を基盤とする神道に傾斜した諸策に対して仏教側からの批判が高まり、最終的には大教院から仏教各宗が相次いで離脱していくこととなった。さらには欧米視察から帰った長州系官僚が再度実権を握っていく。また、欧米の政教関係を学んだ立場、大教院から離脱した仏教各宗の主張を代弁する立場に立った島地黙雷らを中心とする信教の自由論・政教分離論の高まっていくこととなる。こうして神道中心の国家づくり自体が批判されていくこととなり、明治8年[1875]の大教院解体、明治10年[1877]の教部省廃止、内務省社寺局への移管へと向かっていくこととなる。以後、国民教化は神道を媒介しない方法へ(教育―教育勅語)と転換していく。
3. 教派神道と造化三神
明治10年代に入る頃から、信教の自由、政教分離の原則のもと、神道をめぐる政策は修正されていく。その一環として、明治15年[1882]に教導職と神社神職の兼補が廃止される。従来は神職が教導職の役についていたが、それはもはやかなわないこととなる。平田派国学に基づく宗教的神道観のもと制度化された教導職が神職から切り離されることは、宗教活動と神社の分離を意味していた。すなわち、信教の自由、政教分離の原則のもとにおいても、神社と国家(天皇)と国民を結びつけておく経路としておくために、神社での宗教行為は許されない行為とされたのだった。こうして、タテマエ上では信教の自由と政教分離を果たしながら、神社を紐帯とした国民統合を図る、いわゆる日本型政教分離が成し遂げられたのだった。その結果、神社は宗教性が剥奪され、国家の祭祀の最前線に立つことになった。
この詭弁ともいえる論理を可能ならしめたのは、近代的「宗教」概念と信教の自由論に基づく神社非宗教論であった。そもそも「宗教」の語は前近代の日本にはなかったことばで、明治以降になって西洋からやってきたreligionの翻訳語として誕生したものである。重要なのは、ただ単にreligionから「宗教」へとことばが置き換えられたのでなく、religionのことばが持つ文化的、時代的背景もともに日本に移入されたということである。具体的には世界の諸国を文明国、半文明国、未開国の3つに分類し、それに応じて国家主権の有無を説く万国公法体制のもと、文明国の指標とされたキリスト教的宗教観を引き連れてこの言葉は成立したのである。このとき文明国の宗教のあり方とされたのは、聖書など経典によった教義信仰=ビリーフ中心主義的なあり方であった。欧米諸国との出会いの中で、植民地化を回避しつつ自らの主権を確保しようとしていた日本においては、「宗教」という語の移入は、近代化の問題と直結するものだったのである。このことばの移入によって、生活の中で慣習化したプラクティス=儀礼中心であった従来の日本の宗教は、教義的=ビリーフ中心主義的なものへと変貌させられていくこととなる。日本の近代化の課題の中で生まれたこの「宗教」の語は、近代漢語―中国「宗教zong jiao」/朝鮮半島「종교jong gyo」/ベトナム「Tôn giáo」―として、留学生や日本の植民地支配などを通じて東アジアへも席巻していくこととなる。いうまでもなく、そこには文明論的・キリスト教的含意が含まれており、新たに移入された地域の宗教界に変化を迫るものとして機能することとなる。
こうしたビリーフ中心主義的な「宗教」概念を前提にしつつ、神社非宗教論が展開されたのである。無論、いくつもの神道論、思想が展開したことは間違いないが、近世までの神道は神祇信仰、すなわち儀礼的な側面が大きかった。「宗教」概念の移入にあたっては、神道でも教義化が図られていくこととなる。しかし、それがうまくいかない状況が続いていた。こうした、神道における教義化の失敗を逆手にとり、神道を教義信仰、すなわち「宗教」ととみなさないことで、神道の場である神社での活動を儀礼に限定していったのだった。ここにおいて神社への崇敬は「宗教」行為でない道徳行為とみなされるようになる。こうして日本型政教分離は成ったのだった。
ただし、これはあくまでも、国家制度として、であった。依然として、神社は宗教行為の場であり、神道はあの世の問題と関わるものだと考える神職らもいたし、一般の国民にとってもそうした神社のあり方のほうが一般的だった。例えば、平田派・出雲派、神宮教の後身となる神宮奉斎会の関係者が中心となって、宗教としての神道の活動拠点の設置を訴える神祇院設置運動やそれを支える役割も担った全国神職会が展開されていった。むろんこうした宗教性の維持への志向は、宗教者としての矜持のみならず、現実的な問題とも関わっていた。政教分離の原則の中で、神社の役割が限定されていく中で、当初は定額の経費が支給されていた官社でさえも、明治19年[1986]に自社自営の方針が示され、翌年以降大幅に額を減らした保存金が支給されることとなった(官国幣社保存金制度)。こうした中で、明治10年代は、それより下位に置かれた諸社・神職は経済的に困窮する状況となっていた。すなわち、教部省体制の解体の中で、国家からの神社への資金が打ち切られるようになり、自立化が迫られるようになっていたのだった。そうした中で、宗教者たちにとって宗教活動は収入を得る重要な手段だったのである。一般の国民は、いかに明治の世に変わろうとも、依然として前近代から引き続き、神社、神職には現世利益の役割を期待されていたのだった。
では、神道から宗教を切り離す国家の方針のもと、いかにして宗教活動は維持されたのか。以下では、その手段を取り上げることとしたい。
3-1 教派神道化
まず、第一に教派神道として独立することがあげられる。前述の通り、明治国家は国民統合を志して、宗教性を排除した儀礼の神道を創造したが、人々の宗教に対する現世利益・後世安心への需要、渇望が簡単には抑えられないものであるという現実にも向き合わざるをえなかった。その中で、国家とつながる儀礼としての神道と神道の宗教的側面を腑分けし、教派神道として独立させる方針を取るようになる。それをうけた代表的な事例として、出雲大社の対応があげられる。出雲大社は平田派国学の影響をうけながら神道の宗教性を主張する立場にあった。明治15年の神社と宗教活動の分離の後、宗教活動を維持できなくなった出雲大社は、その年のうちに国家の祭祀を担う出雲大社から宗教活動の領域をわけ、それを大社教として独立させている。伊勢神宮とその大麻や伊勢暦の拝察を担った神宮教の関係も同様のものである。むろんすべての宗派において、こうした神社と宗教活動の分離という形で教派神道としてなったわけではないが、当時を生きる人々が求めた宗教活動の受け皿になったという点では共通していた。
こうした役割を果たした教派神道の具体的な教団には、黒住教、神道修成派(明治9年公認)、神宮教、大社教、扶桑教、実行教、大成教、神習教(明治15年公認)、禊教、神理教(明治27年公認)、金光教(明治33年公認)、天理教(明治41年公認)、これに神道大教(神道本局)を加えた13派がある。これらの教団は無条件に公認されたわけではなく、活動公認化に向けて国家の神話体系と矛盾のないものへと自らの変容させる必要があった。その変容の際には、神道の宗教性を強調する平田派神道を下敷きとするものも多くあり、それを通じて造化三神が教義に組み込まれる例も見られた。例えば、柴田花守が創立した実行教では、次のように述べている。
我が教の奉ずる神は多神ならず、我が古典に拠るに、天地生発の初に単独の真神あり、天之御中主神と称す。此の神は天地万物を生み出し之を主宰する神にして、天地に先ちて存し終つ所なきものなり。此一真神の大元霊発動して、男女の徳性備へたる二神に別れ玉ふ、之を高御産巣日神、神産巣日神と称す。此の二神は一真神〈天之御中主神〉のに外ならずして、又一神に帰する者なり。之を造化の三神と名づけ、我が教徒は単に元の父母と称し奉れり。而して我が教は此の主宰神の所在を、我が日本帝国の名山富士山となすものなり。(『神道実行教』)
この実行教は近世に起こった富士講(富士山を、万物を生み出す「もとの父母」と捉え、崇拝する信仰)の系譜を引く教団である。その教義を語る中で、天之御中主神とそこから生じた高御産巣日神、神産巣日神の造化三神を主宰神として、私たちの教義では富士山にその主宰神が所在する、とここでは述べられている。ここに、富士講的信仰が教派神道化する際に、平田派神道が明治初年以来強く主張していた造化三神が組み込まれていることを見ることができる。
また、同じく富士講の系統つぐもので宍野半が開いた扶桑教や、それ以外でも新田邦光の神道修成派、芳村正秉が開いた神習教、井上正鉄の禊教で、天之御中主神を中心に高御産巣日神、神産巣日神を加えた造化三神を主宰神としている宗派がみられる。
3-2 教派神道の配下宗教者化
ただし、どんな宗教者、信仰集団も教派神道化することが可能だったわけではない。それをなすには、天照大神を主神とする黒住教のように国家の神道との教義的親和性、教祖が勤王の志士であった神道修成派のように岩倉具視ら政府要人とつながり、根本となる教義を国家の神道に合わせて修正した天理教のような教派神道化への不断の努力と犠牲が少なからず必要となった。当然、一般の民間宗教者たちの力ではなしうることはできなかった。しかし、彼らには、まだ教派神道(あるいは仏教教団)の傘下で活動するという経路が残されていた。
教派神道の下にはその活動を補翼するための組織として講社を置くことが認められていた。明治の宗教政策のもと、廃業の危機にひんしていた宗教者たちは、自らの講社ごと、あるいは自身が教派神道のもとに下ることで、宗教活動を維持することができた。例えば、神道修成派や山岳系教派神道(御嶽教)がその受け皿となった例がみられる。その際には、比較的自由に従来の活動を続けられた例もみられた。
またこのような宗教者の受け皿が宗教活動の現場でさらに広がっていく事例もみられた。その事例として、長澤雄楯の稲荷講社をあげたい。長澤は、平田派国学の影響を受けながらいわゆる本田霊学を大成した本田親徳の弟子で(同門に副島種臣)、鎮魂帰神を中心とした活動を行う宗教者であった。明治初年の神道のあり方に対する議論の中でも、神道の宗教性を訴える立場に与していた。彼はこの議論のときに関係を持った大社教管長の千家尊福との縁から大社教の教師となり(多数の補任状が残されている)、大社教下で活動を開始し、稲荷講社を結んだと考えられる。ここまでは他の教派神道―講社の事例でもみられた現象であるが、この稲荷講社の場合、さらにその下に別の宗教者や教会を所管した例が見られる。その管下で活動した代表的な宗教者に出口王仁三郎がいる。のちに大本教主となる彼は、明治30年代前半に宗教活動を始めた頃、活動の公認を得るためにさまざまな教派神道の傘下に下ろうと奔走していた。しかし、「御嶽教ニ運動致して失敗し、大成教ニて失敗し、是非なく、又々総本部へ先達参上」し、稲荷講社のもとで宗教活動を実現させていくこととなる。そして、大本教の前身となる金明霊学会もこの講社の管下で活動を展開させていくこととなる。稲荷講社自身も、大社教下での活動から始まったにもかかわらず、である。以上のように、教派神道→講社→所管教会という組織の中のどこかにさえ入れば、宗教活動を実現することが可能な体制となっていた。
こうした体制を念頭に置いてか、果ては教派神道下での活動許可を取るためのノウハウ本も登場するようになっている。それは、その際には無論、教派神道、講社特有の論理をある程度受け入れる必要があったことを反映しているともいえる。稲荷講社とその下の所管教会との間にもそうした関係があり、その活動が認められるためには、教会の形や規約が稲荷講社に認められ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この集団の場合は、霊術という極めて実践的な宗教活動をしていた。それは「人間は大精神(天之御中主神のこと。広義には天地を創造された天之御中主神・高御産巣日神・神産巣日神の所謂「造化御三神」を指す)たる産霊の大神から小精神たる霊魂、即ち産霊大神の分霊を賜っている」とする霊魂観に基づいた実践となっていた。この講社に参加する人々も、その傘下の教会に参加する人々もこの霊術を共有し、実践していたことから、これを通じて造化三神の働きについてのイメージが一般の人々の間にも広がっていったと考えられる。教派神道の中には造化三神を主宰神とするものが多く、そのもとに多くの宗教者や信者が集ったと考えれば、国家の神道の教義においては後景に退けられた造化三神は、教派神道の信仰を通じて、民間=宗教活動の現場で受け入れられていくこととなったといえよう。
4. 東アジアの造化三神という視点に向けて
以上、明治国家の宗教政策の中での造化三神の行方を簡単みてきた。造化三神は、政策の中枢からは遠ざかっていくこととなるが、平田派の神道論を型にした教派神道によって、民間に展開していくこととなったのだった。
実はまだ宗教活動の実現の手段はあった。第三の方法として、海外での宗教活動があった。というのも、外地では、内地と違う宗教法制がとられていたため、宗教活動をおこなうことが可能な状況が続いていた。例えば、台湾総督府下では大正12年[1923]まで神社行政と宗教行政が未分離状態であったし、朝鮮総督府下では「神社寺院規則」「布教規則」の二本立ての社寺宗教行政がとられていた。こうした背景をもとに、神職たちは「神官教導職兼補の廃止は。内地に於いても仍ほ例外あり。即ち府県社以下の如し。更に例外の例を拡め。政府は台湾島に於ける神道布教の便を謀り、同島に新設すべき官国幣社以下の神官は。暫く之に教師の事を兼ね行はしむるを以て。頗る時宜に中れりとする也」と認識していたという。さらには、宗教活動の実践に向けて、神職たちの中には、「明治三十年代の日本在野神道者間に、神道を世界的に宣布しなければならぬとの気運が起つてゐた」という。こうして、宗教活動の実践を願う者たちは積極的に海外への進出を訴え、赴任していった。
日本の神道の海外布教の嚆矢となったのは、明治16年[1883]の神道修成派の朝鮮布教だった。この例に見るように、教派神道の海外布教と植民地神社政策の連続性があった。明治23年[1890]から、黒住教は京城で祈禱・病気直しを始めるようになる。日本領事館はこれに賛意を示していた。黒住教はその拠点として京城大教会を設けるが、これが京城神社の前身である南山大神宮へ変化していく。教派神道の布教が公設の神社へとなっていく様がここからみられる。釜山の竜頭山神社にも神習教の海外布教が関わっていたとされる。台湾の場合は、元神宮教教師で台湾神社初代宮司山口透の活動が代表的な例となる。いずれも宗教性が優先されながら、植民地布教が進んだことを表すものであろう。
彼らが担った役割や、そこにみられる造化三神の展開について、史料的に不足しているためあくまでも展望を示すことしかできないが、明治期以降の担い手を考慮しつつ近代における日本からの広がりについての見通しをのべて、本稿を終えることとしたい。
教派神道を含む神職たちの活動の中で造化三神が強調されている例はまだ見えていない。しかし、植民地(札幌、樺太含む)において、総鎮守として開拓三神(国魂神、大巳貴命、少彦名命)が置かれたことは注目して良いように思える。どのような理由をもって、この三神が選ばれたかは不明であるが、新領土を開くに際して、天孫降臨に先駆けて国土を整えるという神話の役割を期待する文脈からか、国土の開闢を説く造化三神と同じ三神という形式がとられた点には何らかの連続性が想像できる。そうした意味では、『古事記』の時点では。東アジアの普遍性のなかに自らを位置づける論理であった造化三神が、近代には植民地主義を支える論理へと転化していると評価できようか。ただし留意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は、肝心の朝鮮においては総鎮守に関する議論の中で、祭神の候補にすらあがらなかったということである。むしろ、三韓征伐に基づく侵略と結び付けられた神功皇后や日鮮同祖論と関係づけられた素戔嗚命=曽尸茂梨一体説に基づく素戔嗚命の祭神化でみられる神話的統合のほうが、より直接的な意味があったと考えられる。その意味では、造化三神が、日本帝国主義に覆われた近代東アジアの底流にどのように響いたのかを考えていく必要があろう。
また、積極的に植民地布教を進めた教派神道には、先述の通り、主宰神に造化三神を位置づけるものも多かった。教派神道にならずとも、大本のように積極的に大陸の宗教者と交流した教団もある。植民地において日本宗教は文明論的な文脈における近代的「宗教」として植民地の人々と対峙することとなったであろう。日本内地においてキリスト教がそうであったように、一方では、上からの啓蒙的態度を取りながら、その一方では、当地の近代化のための憧憬の対象とされたであろう。日本宗教との対峙の中で天道教や普天教の文明化が進むことになる。彼らはまた文明の担い手として、民間宗教を啓蒙していくこととなる。こうした過程において、日本の近代化過程において、下野していった造化三神が近代的「宗教」のひな型として広がった可能性は捨てきれないのではなかろうか。








 댓글 0개
| 엮인글 0개
댓글 0개
| 엮인글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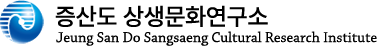

 인쇄
인쇄 스크랩
스크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