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오동·청산리 대첩 100주년, 승리의 숨은 조력자 ‘체코군단’ 1
정원식 연구위원
봉오동·청산리 대첩 100주년, 승리의 숨은 조력자 ‘체코군단
역사의 뒤안길로 서서히 저물어가는 경자년 올해는 제국주의 일본 식민지로부터 자유와 광복을 맞아한지 제75주년이 되는 해이다. 동시에 6월 7일과 10월 21일은 항일무장투쟁사에서 신기원으로 기록된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에서 각각 승리를 거둔지 100주년이 되는 뜻 깊은 날이기도 하다.
<봉오동 전투 지역과 청산리 전투 지역>
독립전쟁 제1차 대승리---봉오동 전투
100년 전 1920년 6월 7일 봉오동 전투는 우리 독립군 연합부대가 두만강을 넘어 일본군을 공격하여 괴롭히자, 이에 일본군은 별동부대를 편성하여 지린성 왕칭현 봉오동 근거지를 토벌하려다가 우리 독립군의 유인작전에 걸려 대패한 전투를 말한다.
봉오동 전투 발발 전 1920년 3월에 작성된 일본 정보자료에 의하면, “1920년 1월부터 3월까지 우리 독립군은 국내진공작전을 총 24회를 실시하여 일본군에게 많은 피해를 주었다.” 또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관지 《독립신문》 1920년 12월 25일자 기사에는 “1920년 3월부터 6월 초까지 우리 독립군이 일제 관공서를 파괴한 곳이 34개소에 달한다.”고 보도하였다.
이는 일본군에게 상당한 압박감으로 작용하여 일본군이 토벌을 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 이때 우리 독립군 부대는 소대, 혹은 분대 단위로 익숙한 주변 지형과 지물을 활용하여 치고 빠지는 게릴라전법을 적극 구사하였다.
실제 일본군이 토벌군을 편성하여 소탕에 착수하게 된 것은 바로 봉오동 전투가 벌어지기 이틀 전 1920년 6월 5일 대한신민단의 독립군 부대가 함경북도 종성군 강양동에서 일본군 순찰소대를 타격한 사건에서 비롯되었다. 다음날 6월 6일 일본군 1개 소대 병력이 두만강을 건너 추격해오자, 최진동·운산·치흥 삼형제가 이끈 군무도독부와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그리고 안무의 대한국민회군 등이 연합하여 결성한 ‘대한북로독군부’의 독립군은 삼둔자(三屯子)에서 일본군 추격대를 공격해 큰 피해를 입혔다. 이때 이화일 소대장의 유도작전이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이에 일본군 야스카와 지로(安川二郞) 소좌는 이를 구실로 함경북도 나남에 주둔하던 제19사단 월강추격대대와 남양수비대 1개 중대 총 500여 명을 이끌고 독립군 근거지인 봉오동 토벌에 나섰다. 이때 대한북로독군부와 한경세의 대한신민단의 독립군 연합부대(1,200여 명)가 일본군 토벌대인 최정예 정규군 맞서 싸워 승리한 전투가 바로 ‘봉오동 전투’이다.
상해 임시정부의 기관지인 독립신문은 1920년 12월 25일 자에 “일본군 전사자 157명, 중상 200여 명, 독립군 전사자 4명, 중상 2명”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이 봉오동 전투는 1월 7일 상해 임정이 무장독립전쟁을 선포한지 5개월 만에 거둔 승리로써 “독립전쟁 제1차 대승리”라고 규정했다.
<독립군의 봉오동-청산리 대첩과 일본군 토벌작전 현황>
독립전쟁 제2차 대승리---청산리 전투
한편, 일본군은 봉오동 전투에서 대패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음은 물론, 북간도 지역 내 독립군의 항일무장활동이 심상치 않음을 깨닫고 대규모 독립군 토벌작전계획에 착수했다. 그 첫 번째 정지작업으로 일본군은 두만강 건너 중국 영토 내에서 원활한 토벌작전 수행을 위해 10월 2일 중국 마적단 두목 창지앙하오(長江好)로 하여금 훈춘(琿春)의 일본영사관을 공격할 것을 사주한다. 이에 따라 400여 명의 마적단이 훈춘성을 공격하여 살인, 방화와 약탈을 자행하여 중국인 70여 명, 조선인 7명, 수명의 일본인을 살해했다. 그리고 비어 있던 일본공사관을 불태웠다. 이른바 훈춘사건(琿春事件)이다.
일본군은 이 훈춘사건을 트집 잡아 중국 영내로 진입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하여 대규모 독립군 토벌부대를 편성했다. 토벌부대를 세 방향에서 북간도로 이동시키는 구체적인 작전계획을 수립하여 착수했다. 바로 서남쪽 방향에서 북만주 파견대와 관동군 2천여 명, 시베리아 출병으로 파병된 블라디보스토크 동쪽 방향에서 포조군(제11사단과 제14사단)4천여 명, 남쪽 방향에서 조선 주둔군 19사단(함경북도 나남)과 20사단(서울 용산 주둔)1만여 명 등 총 1만 7천여 명이 독립군을 포위공격 하려고 하였다.
이때 여러 독립군 부대들은 일본군과 적극 싸워야 한다는 주전론(主戰論)과 싸움을 피해야 한다는 피전론(避戰論)이 맞섰으나, 현실적으로 피전론이 채택되었다. 그리하여 독립군 부대들은 일본군을 피하기 위해 독립군 병력은 두만강 상류인 중국 지린성 화롱현 청산리 일대로 이동한다. 이 과정에서 일본군과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것이 그 유명한 ‘청산리 전투’다.
<청산리 일대 독립군 부대들과 일본군 간 전투>
이 전투에서 우리 독립군 연합부대가 10월 21일부터 10월 26일까지 5박6일 동안 10여 차례 전투 끝에 일본군 토벌부대를 대파하였다.
다시 말해, 중국 지린성 화롱현 청산리 지구에서 김좌진 장군이 이끄는 북로군정서와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 국민회군, 의군부, 한민회, 신민단 등 독립군 연합부대 1,400여 명이 백운평 전투를 시작으로 완루구, 어랑촌, 고동하 등에서 일본군 토벌부대 1,254 명에서 많게는 3,300여 명을 사살하여 대승을 거둔 것이다.
그렇다면, 봉오동과 청산리(이하 봉·천)전투에서 비정규군, 소위 민병대라 할 수 있는 우리 독립군 연합부대가 당시 최첨단 장비로 중무장한 일본 상비사단 정예군에 맞서 승리할 수 있었던 배경은 뭘까? 칼과 창, 활이 근간이 되는 전근대적인 근접전이 아닌, 최첨단 무기체계가 핵심이 되는 봉오동과 청산리의 근대전(近代戰) 전투에서 단순이 정신력만으로 일본 정예군과 싸워 승리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정신력만으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은 봉·천 전투 발발 26년 전인 1894년 12월 5일(음력 11월 9일) 갑오년 동학농민전쟁 시 충남 공주 우금티 전투에서 증명되었다. 칼과 창, 죽창, 낫, 괭이 등 전근대 무기로 무장한 동학농민군이 근대전의 최첨단 무기체계로 무장한 조선 정부군과 일본군 연합 토벌대에 맞서 싸웠다. 이것은 마치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요, 바위에 계란치기와 같은 무모한 싸움이었다. 이는 상대와 대등한 싸움인 전투가 아니라, 토벌 연합부대에 의한 일방적인 동학농민군의 도륙전이라 할 수 있다. 소위 전투를 가장한 대량 학살이었다. 그 만큼 우금티 전투는 근대전에서 무기체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봉·청대첩의 주요 요인--체코군단으로부터 첨단무기 획득
여기서 봉·청 전투에서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요인을 전쟁이론과 함께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다.
우선, 전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간적 요소가 중요하다는 '인간중심론적 전투수행론'과 군사기술적 요인이 결정적이라는 '기술결정론적 전투수행론'이 그것이다. 기술결정론적 전투수행론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적 요소가 첨단무기 혹은 이로 구성된 첨단전력의 보유 여부라는 관점을 취한다. 반면 인간중심론적 전투수행론은 전쟁이 불확실성과 마찰이 지배하는 영역이라는 클라우제비츠적 명제를 충실히 계승한다. 따라서 첨단무기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전쟁의 불확실성 요소를 극복할 수 있는 군사적 천재의 존재 여부, 즉 군사지휘관의 자질이나 군대의 훈련 여부를 중시한다.
이에 근거한 필자의 판단은 봉오동과 청산리 전투의 승리는 '인간중심론적 전투수행론'과 '기술결정론적 전투수행론' 간의 절묘한 조합의 결정체라 할 수 있다.
'인간중심론적 전투수행론'에서 최진동·최운산 장군, 홍범도 장군과 김좌진 장군 등은 한편으로 독립군 병사들에게 군인으로서 무한한 존경과 신뢰에 기초한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했다. 동시에, 전투 현장에서 전술적 지형의 정확한 파악과 숙지, 그리고 여러 유형의 실전 같은 교육훈련을 통해 독립군 개개 병사들에게 싸워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특히 독립군은 전투 현장의 지형지물을 이용한 은폐·엄폐에 의한 매복과 기습전이라는 뛰어난 유격전 구사능력을 발휘하여 승리를 견인하는 한축이었음을 봉·천 전투에서 여실히 증명해 보였다.
그렇다면, 승리의 또 다른 축이었던 '기술결정론적 전투수행론'으로 설명되는 첨단무기 보유는 당시 우리 독립군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것은 당시 유럽의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국제관계의 역학관계 속에서 러시아(소련)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 와있던 체코슬로바키아 군단으로부터 구입한 것이다.
이는 체코군단이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이용해 9,000 킬로미터가 넘는 극동으로 오게 된 배경에는 체코가 당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1867년~1918년)의 식민지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과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전쟁 상황이 빚어낸 결과였다.
그렇다면, 여기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탄생과 체코의 식민지 지배,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체코군단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어는 지를 간략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댓글 0개
| 엮인글 0개
댓글 0개
| 엮인글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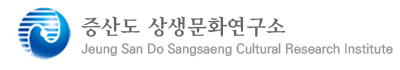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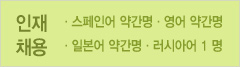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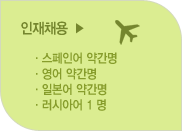
 인쇄
인쇄 스크랩
스크랩








